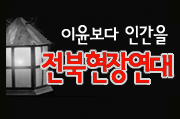위클리 포커스 27호
2003년 9월 22일, 발행처 : 정치사회연구소(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ips2003@hanmail.net
이라크전 이후 터키와 미국
터키의 여론조사
지난해 터키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터키의 우방은 어느 나라인가?” 이 물음의 대답은 이전 같으면 미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응답자의 34%가 우방이 없다고 답했다. 겨우 27%만이 미국을 적었다. 이라크 전쟁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 숫자는 터키와 미국이 “믿음직한 동반자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변화는 터키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터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감정이 점점 노골적으로 들어난다. 이처럼 달라진 두 나라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터키 외무장관 압둘라 굴(Abdullah Gul)이 지난 6월 워싱턴을 급거 방문할 정도다. 그러나 사태는 쉽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 그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이 두 나라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냉전시대의 맹방
터키와 미국은 말 그대로 오랜 맹방이다. 미국은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활용했다. 터키는 소련의 군사 위협에 벗어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 결과 미국과 터키는 더 할 수 없는 맹방이 될 수 있었다. 터키의 미공군 기지는 소련권을 감시했다.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전까지 이라크 군부대의 이동도 견제할 수 있었다.
물론 미국이 터키에 베풀어 준 대가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터키를 중동의 거점국가로 지원했다.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이슬람 문명권에도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터키를 그 모범 국가로 발전하게 했다. 경제원조는 물론이고 군사력, 심지어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터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만이 아님을 입증하려는 것처럼 거대하게 행해졌다.
달라진 시대 상황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지금 터키는 80만 평방 Km, 6700만 명의 인구, 개인당 GNP 8000불, 55만의 군사력, 여기에 오스만 제국을 건설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터키의 역사는 세계사의 주인공이었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있다. 1200년대 말부터 600년 동안 세계적인 대국을 건설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예로서 말이다. 서아시아 일대는 물론이고 발칸반도와 북아프리카 일대를 통치했던 오스만 제국은 동서 문화의 융합은 물론이고 새 역사로 달려가는 거대 국가의 경륜도 경험했다. 1차대전에 독일 쪽에 가담했기 때문에 패전과 분열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케말 무스타파의 주도로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다. 비서구 저개발국가들이 그렇듯이 터키도 지난 60, 80년의 두 차례 군부 쿠데타를 경험했다. 그러나 89년부터 민간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지금은 이념의 경직성을 넘어 좌우 연합정부를 이룩하고 있다.
터키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서려 한다. EU에도 가입하고 싶고, 2만불 선도 넘보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마음 같아서는 미국과 맞서고 싶고 세계적인 당당함도 보여주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터키에 요청하는 미국의 이라크 파병도 묵살하지 않고 있다. 무려 2만 명의 군대를 말이다. 그것이 터키를 위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가 더 할 수 없는 “인내”를 보여줄 때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맹방이 아니라, 세계 정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나라가 맹방임을 알아야 할 때를 점점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혁명”
“10억의 호경기”
최근 홍콩 외국계 회사의 한 간부는 “아시아 10억 인의 호경기”라는 레포트를 발표했다. 이 글은 아시아에서 지난 10년간 소비자 혁명을 적어 놓았다. 인구 구조의 변화, 점증하는 부(富)로 아시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분명히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 사람들은 달라졌다. 개인의 수입도 늘었다. 안정된 소득, 높은 저축률, 인구 출생율의 감소 등은 혁명적이다. WTO의 규제에 의한 무역 패턴은 서구에 문호를 완전 개방했으며 북한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는 이제 “글로벌”시대의 생활로 달려가고 있다.
이질적 현상
여기에 다음 몇 가지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2차대전 후 미국의 출산 열기(baby boom)로 태어난 젊은이들이 반전 운동을 주도했듯이, 아시아 출산 열기의 당사자들은 이제 2-30대로 “새 아시아”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왕성한 활동기로 접어들었다. 이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원한다. 이들의 수는 아시아 전역에 약 10억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하면 10억의 젊은이들이 어버이 세대와 다른 삶을 꾸려가는 “새 아시아”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둘째는 이들은 서구형 생활 패턴을 따른다. 한 세대 이전 미국에서 보여준 변화, 즉 전체 인구의 증가율 보다 가구의 증가율이 더 높은 현상이 지금 아시아에도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다. 일본 노인 중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한 세대 사이에 85%로부터 30%로 줄었다. 1990년의 통계는, 80세 이상 노인 중 가족과 같이 사는 비율이 불과 18%로 되어 있다. 젊은이들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새 집부터 마련한다. 그 집에 세계적인 유명 상표의 냉장고, 오븐, 토스터, 세탁기, 스테레오 그리고 유행하는 새 자동차부터 구입한다. 어릴 때 살았던 그 집과는 너무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중산층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
“아시아적 가치”의 붕괴
10억의 젊은이들이 펼치는 삶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충격적이다. 정치적으로 이들은 권위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 평등주의자다. “나보다 뛰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지배할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반(反)엘리트주의를 의미한다. 그들은 전통의 가치도 받아들이려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늘”만이 중요할 뿐이다. “어제”는 그들과는 무관하다. “내일”도 그들과는 무의미하다. 그들의 것은 “오늘” 뿐이다. 땀의 의미는 돈으로 환산되는 수치로만 표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실함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도로 여긴다.
지난 30여 년간 GDP는 미국의 576배로 늘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무려 1067배나 되었다. 그처럼 늘어난 부(富)가 소비로 달려가고 있다. 10억의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소비 물결이 넘치고 있다. 1997년만 해도 아시아의 평균 저축률은 31.6%였고 중국은 75%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소비에 맛들인 세대가 달리기 때문이다.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신용카드다. 그것이면 월-마트, 코스토코, 테스코에서 어떤 것도 구입할 수 있다고 믿는다. BMW를 몰고, 마텔 코냑을 마시면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구치 신발을 신고 이탈리아 식당에서 저녁 먹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일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신용카드를 쓰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아시아에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IPS